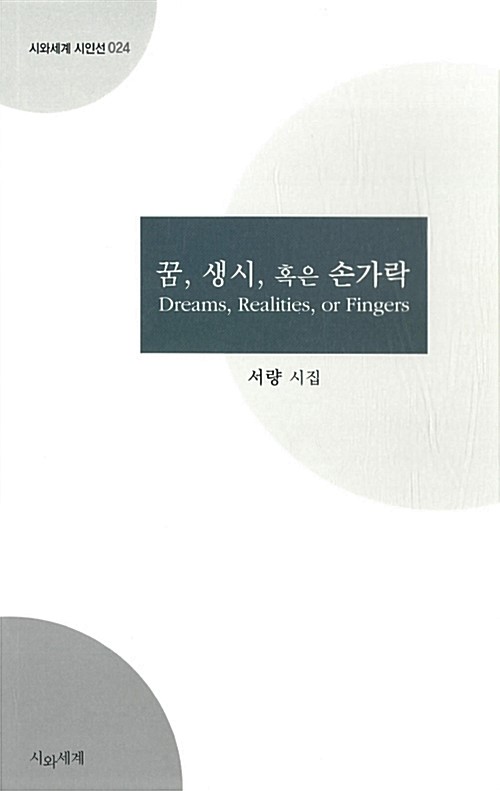
서량 (69), 네 번째 시집 출간
김병오 (69)
서량 동문의 네 번째 시집, 『꿈, 생시, 혹은 손가락』이 출간됐다.(출판사 '시와 세계' 2016년 8월 29일 인쇄, 120쪽) 1988년에 뉴욕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온 그는 「만하탄 유랑극단」(문학사상, 2001), 「브롱스 파크웨이의 운동화」(문학사상, 2003)와 「푸른 절벽」(황금알, 2007)을 출간했다. 현 시집은 구글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본지 시계탑 편집위원인 그의 새 시집을 작품해설의 일부분이며 의대 학창시절에 문예반을 함께했던 본인과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을 기록하며 책 소개를 대신한다.
. . . 시인은 무의식과 자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어에의 시적 주체를 세우려고 한다. 당신이라는 언어는 시인이 상정하는 객관성의 다른 말이며, 자신을 점령하고 있던 무의식의 문을 두드린다. 언표로부터 침묵을 드러낼 때 무의식은 고요의 숲에서 해방되는데, 자아가 직접적인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 "당신이 내 기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이해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 「3월의 변명」
소극적 화자는 감각의 중심에서 주체의 자리가 축소되지만 그 자리에 시적 영역이 강화된다. 언어에서 발현되는 시의 주체는 자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편적 무의식에서 개방된다. 요컨대 무의식의 언어로서 자신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신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쓰기의 행위는 자신이지만 그것에의 주체는 무의식의 언어에 자신을 혜량함으로써 세계 내부를 인식하는 대상과 교섭을 가능케 한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 내부적 존재와 교섭을 위해 마음 쓰는 상태를 '배려(Besorge)'라고 했다. 서량 시인의 '배려적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을 드러내는 기호작용이며, 자신을 배제시킨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시적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 . -- 권성훈(문학평론가, 경기대 초빙교수)의 작품해설, 「배려적 언어와 무의식의 꽃」에서
*
량아,
오늘 자네의 네 번째 시집을 받았다. 표지도 제목도 참하고 은은하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야 할까. 옛날 숨결이 더 깊어진 따뜻하고 친절한 시들이 많았다. 자네가 애써 거부하는 고상함과 진지함이 전편에 아름답게 흐른다. 울림과 용량이 크다. 무의식(無意識)도 늙으면서 더 익어가는 모양이지. 간주(間奏)처럼 나타나는 매력적 서정성과 미분 수준으로 파고드는 감수성의 표현이 눈물겹다. 자네는 지금 한국시단에서 아무도 따르지 못하는 독특한 경지에 이른 것 같다. 그 동안의 마음 고생, 갈등, 고뇌의 사색은 어떠했으리. 아직은 멈추어야 할 때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더 훨훨 날아라!
숙독을 하면서 공감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학생강실 어둑한 저녁이 머리를 스쳐간다. 도서관 불빛을 애써 외면하던 경계인들의 불안과 저항이 아직도 꿈에 나오는데. 자네는 학생강실이 피워낸 꽃이다. 우리 문예반이 소설이었다.
자네 시에서 순진과 처녀성을 제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름다움이 자네 시의 생명이기 때문에. 현상의 뒷면을 응시하며 그 미로를 따라가는 결백증의 아이. 거짓말을 못하던 자네의 젊은 날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부디 건강을 아껴 낙천적인 세상을 살기를. 우리, 미리 죽지는 말자. 다음 시집은 어느 경지에서 받아 볼지 궁금하다. -- 2016.10.6
*
병오야,
갑자기 옛날 문예반 시절 기억들이 벙긋벙긋 떠올라서 밤잠을 설쳤다. 내 시를 일부 독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난해시'라 부르고 기성시인들은 '실험시'로 분류하는 마당에, 성능 좋은 고감도 수용기(受容器)처럼 나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자네 감성 때문에 콧날이 시큰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멀쩡한 일상(日常)을 소재로 해서 초현실적 시상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짓인가를 나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다.
옛날에 자네와 같이 지냈던 문예반 시절이 무진장 그리우면서 그 처연했던 철부지 젊음의 절망과 방황의 밑거름이 고맙기도 하다. 당시에 문예반을 함께한 상큼한 문우(文友), 지금도 변함이 없을 자네 곁, 계성씨에게도 안부 전해주기를. -- 2016.10.7
*
량아,
요즘 한국시인들의 작품을 섭렵해 보았는데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들 각자각자도 오래 연마한 내공의 성과를 향유하겠지만 그들의 인생 체험과 안목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소문난 시인들이 쓴 명작들의 이미지가 이미 자네 시 귀퉁이 여기저기 녹아 있음을 감지한다. 자네 시 한편에서 10개 이상의 멋진 시들이 옷을 털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자네도 기성시인이지만,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근엄한 언성으로 시를 쓰면 보나마나 대가(大家)가 따로 없을 것이네.
오늘 편집장 권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고받은 서한을 남들에게 보여줘서 이번 시계탑에 자네 시집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좋은 역작 앞에서 가끔씩 쓸쓸해지는 지면들이 마음에 안쓰럽다. 아무튼 그리웠던 옛정을 다시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기뻤다. 자네의 사랑에게도 안부 전한다. -- 2016.10.8
'잡담, 수다, 담론, 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잡담| 아버지의 방패연에 대한 추억 (0) | 2021.04.05 |
|---|---|
| 굿바이 2020 태권도 킥 (0) | 2020.12.23 |
| |기고|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0) | 2019.10.29 |
| |게시| 최진훈의 두 번째 수필집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서평 (0) | 2017.01.31 |
| |게시| 시(詩)의 매혹 / 김애리 (0) | 2016.12.17 |